하늘이 낳은 백성
세종은 여자 환자들이 남자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것을 꺼러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녀제도를 확장했습니다. 세종시대이 의료조건에 대해서는 의녀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과, 의학서적을 편찬하고 국산 약재(鄕藥]를 개발한 것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종은 재위 5년에 나이 어린 지방의 관비官婢 중에서 현명한 자를 뽑아 중앙에서 교육하고 다시 본고장으로 내려 보내게 했습니다. 이 제안을 한 허도에 따르면, 사람은 “그 위급할 때를 당하면 비록 종실의 처자處子라 할지라도 의원을 구하여 치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드디어 남자 의사(男醫]로 하여금 살을 주무르게 하니, 그 남녀의 분별을 삼가는 뜻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 “진찰해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끝내 질병을 다스리지 못하고서 요사天하는 자도 있다."는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남녀 분별로 치료받지 못하는 처자를 위해 여의사를 선발해 교육시켜라!
태종이 비록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성에 여의女醫를 두게 했지만, 그 혜택이 도성 안의 부녀자에게만 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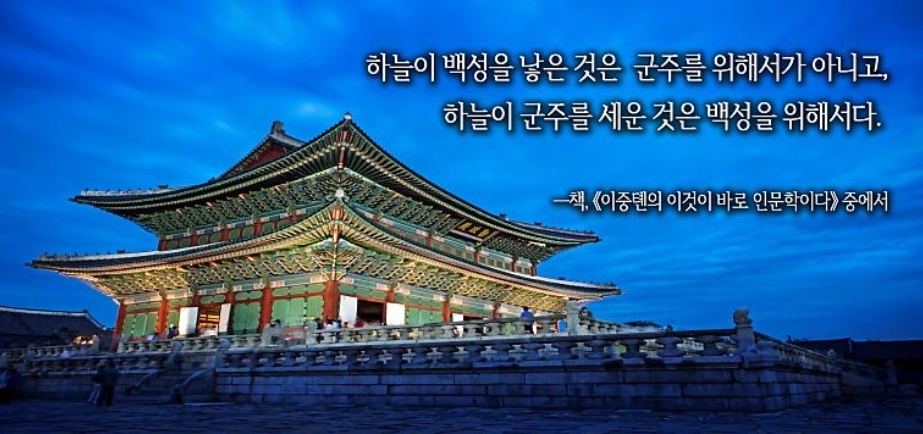
의학서적 편찬 세종은 유효통 등에게 명해 우리나라 고유의서와 중국 의서를 참고하여 《향약집성방)을 편찬하게 했고(재위 15년 완성), 재위 27년에 집현전 학사들과 의관들에게 국내외 의서 153종을 참고해 종합의서인 《의방유취를 편찬하게 했다. 이 중에서 《의방유취)는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동양의학의 결정판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종처럼
다. 따라서 의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자는 게 허도의 주장이었습니다.(세종실록》 05/11/28 세종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충청·경상·전라도 지역에서 선발해 올린 관비를 제생원濟生院으로 보내 침구와 조게법을 가르친 후 다시 본거지로 돌아가 그 지역의 부녀를 치료하게 했습니다.(세종실록》 05/12/04
한마디로 세종은 재위기간 내내 일평생을 백성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데民惟邦本食爲民天] (……) 해마다 흉년이 들어 환과고독
과 궁핍한 자가 먼저 그 고통을 받으며, 떳떳한 산업을 지닌 백
성까지도 역시 굶주림을 면치 못하니, 너무도 가련하고 민망하다.”면서 니라 창고를 열어 기민을 구제하는가 하면 사람을 파견해 구휼사업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세종은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다.
면, 감사나 수령이 모두 교서를 위반한 것으로써 죄를 논할 것이라.” 하여 관리들로 하여금 구휼업무에 전력하도록 강조하곤 했습니다.(세종실
록) 01/02/12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은 백성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제생원 제도를 보완해 버려진 아이들의 사망을 막는 한편, 노비의 출산휴가를 파격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의료제도를 개선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줄이려 노력했으며, 감옥에서 억울하게 병들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규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농사직설農事說》 편찬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을 개발하는가 하면, 대규모 북방사민과 개간척 사업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켰습니다. 그 결과 토지1결당 쌀 생산량이 최고 4배가량 증가하는 등 나라의 경제사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세종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대화를 자세히 고찰한 김홍우 교수는 《세종실록》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숨
마음경영 363은 고통을 일찍이 이처럼 어루만져준caring 적도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에 족한,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생생한 사례들의 압권이다.” 김홍우,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한국정치의 현상학적 이해), 2007, 523쪽
다시 말하면 세종은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준 어진 임금이었다는 말인데, 필자는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 군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비의 출산제도를 개선하고, 들판에 나가 농부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죄수와 군인과 어린아이의 처지를 가엽게 여겨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어루만져 준 단적이 사례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거기서 더 나아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앙부일구仰釜日큼를 만들어 도성 가운데 내어놓았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우리말에 일치하는 글자를 창제해 배울 수 있게 한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세종이 앙부일구, 즉 해시계를 만들되 백성들이 보는 혜정교惠政橋와 종묘宗廟 앞에 놓도록 하여 해시계의 시신時神을 그려서 “무지한 자로 하여금 보고 시각을 알게” 《세종실록 19/04/15한 세종의 의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은 권력과 돈을 가진 세력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4 세종처럼
“문자를 만들어 백성의 인식을 높이고 해시계를 만들어 시간이라는 정보를 공유케 하라.”
세종은 또한 경회루 남쪽에 보루각報漏閣을 세워 자동 물시계가 알리는 시간을 경회루의 남문에서 월화문으로, 그리고 광화문 대종고大故로 “차례로 전하여 치게 했습니다. 또한 낮 오시(午時: 낮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과 광화문의 종을 보루각의 시각에 맞춰 울렸습니다. 《세종실록》 16/07/01 말하자면 양반 지배층들이 독점하던 '문자 권력'과 '시간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여 백성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종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노비조차도 “하늘이 낳은 백성(天民] 《세종실록》 26/07/24 이라고 보고,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해 만물을 다스리는 것人君之職代天理) 《세종실록》 09/08/29이라 생각
수표水標수표는 세종 23년(1441년)에서 세종 24년(1442년)에 걸쳐 제작, 서울 청계천과 하천수위河川水位 측정계測定計이다.